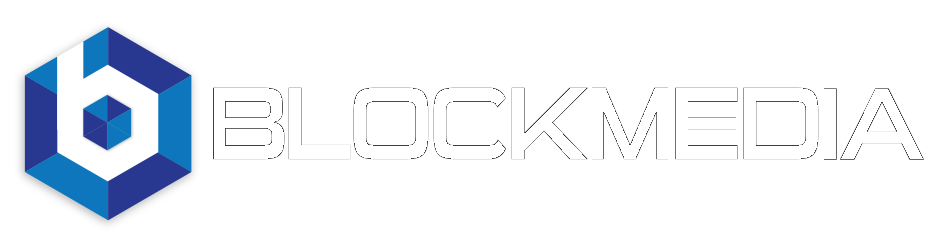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사고(thinking)’ 실험으로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이 있는데요.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이를 빗댄 ‘양자 증권시장’에 대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몰고 온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향후 실적 전망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로 나눠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은 2025년 주당순이익(EPS)을 △최대 13.50달러 △최소 7.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각각 경기 ‘안정’과 ‘침체’를 전제로 한 예측인데요.
단일 수치를 제시하던 기존 가이던스 방식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넓은 범위입니다. WSJ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이를 ‘슈뢰딩거의 고양이’에 비유했습니다.
델타항공, 프런티어항공 등도 최근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적 전망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ASML 역시 유사한 방식을 썼습니다. 이 회사는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종 결과는 한동안 알 수 없다”며 넓은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도 많은 기업이 실적 가이던스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뚜껑을 열어봐야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다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과 똑같습니다.
가이던스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도 나옵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은 지난 2018년 WSJ 기고문을 통해 “가이던스는 단기 실적 중심의 문화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수치 대신 수요, 유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설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적 미달 시 충격은 크겠지만, 시장이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예측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업이 실적 가이던스를 멈춘다고 해도 분석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치를 내놓습니다. WSJ은 실적 발표가 도박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