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제도, 함께 설계해야 지속 가능해야”
“홍콩, 웹3 제도화를 현실로 만드는 시작점”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홍콩은 웹3를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사회 전반의 신뢰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도화를 추진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제프리 츄이(Jeffrey Tchui) 헤데라 아시아태평양 생태계 총괄 부사장이자 홍콩 웹3 산업 민간 협회 웹3 하버(Web3 Harbour) 상무는 지난 14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블록미디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신뢰의 기반”이라며 “기술이 아니라 신뢰, 중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신뢰의 구조’는 단순히 철학적 구호가 아니다. 제프리 상무는 블록체인을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한다. 그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데이터도 넘쳐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은 변조할 수 없는 기록 구조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 방식, 분산된 권한을 통해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가 이런 관점을 갖게 된 배경에는 기술, 산업, 제도를 모두 경험한 이력이 자리한다. 제프리 상무는 지난 2020년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 코그니전트(Cognizant)에서 홍콩·마카오 지역의 인공지능·데이터 분석을 총괄했고, 이후 BCW 그룹에서 블록체인 전략과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해시그래프 기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웹3 생태계 확산에 나섰다. 현재는 HBAR 재단과 웹3 하버 양쪽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프리 상무는 “웹3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지금은 코드를 짜는 것만큼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논의에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는 덧붙였다.
“홍콩, 웹3 제도화를 현실로 만드는 시작점”
제프리가 상무로 활동 중인 웹3 하버는 홍콩에 기반한 민간 산업 협회다. △디지털자산 거래소(VATP) △장외거래(OTC)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등 다양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홍콩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규제는 혁신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실험 결과를 제도화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며 “민간이 먼저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성을 시험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웹3 하버를 중심으로 홍콩 정부와 협력해 ‘웹3 정책 설계안(블루프린트)’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홍콩 정부의 입법 주기에 맞춰 정책 반영을 목표로 제출됐다. 그는 “홍콩의 웹3 입법은 9개월의 연구, 3개월의 정책 설계, 3개월의 입법 논의 등 약 18개월 주기로 진행된다”며 “웹3 하버도 이 주기에 맞춰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처럼 민간이 입법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프리 상무는 홍콩처럼 제도 기반이 마련된 지역에서도 웹3 생태계 전반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웹3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표준의 부재’를 꼽으면서 “실물자산 토큰화(RWA), 온체인 데이터, 커스터디 등 다양한 기술 영역이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기준 없이 시작된 프로젝트는 실패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이 있어야 규제도 명확해지고 시장도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그는 헤데라를 사례로 들었다. 제프리는 “헤데라는 해시그래프(Hashgraph) 기반 고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빠른 거래 처리와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며 “구글·IBM·LG전자·도이치텔레콤 등 39개 글로벌 기업이 검증자로 참여하는 분산형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 구조뿐 아니라 운영 주체 측면에서도 책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신뢰를 구조화하는 기술, 그리고 공동체
이날 제프리 상무는 신뢰를 설계하는 데 있어 기술만큼이나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은 기술보다 그 프로젝트가 자신을 대변하는지를 먼저 본다”며 “커뮤니티는 단순한 지지 집단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함께 만드는 주체”라고 말했다.
이런 공동체 중심 접근은 단순한 기술 설계를 넘어서 각 지역의 문화와 현실을 반영한 전략 수립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아시아의 경우 겉으로는 단일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어, 문화, 제도가 모두 다르다”며 “탈중앙화, 자산 소유권, 신뢰라는 공통 원칙 위에 각 지역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얹어져야 진정한 웹3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웹3의 구조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프리 상무는 또한 웹3의 미래가 인공지능(AI)과의 결합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내다봤다. 그는 “AI는 효율을 높이지만, 신뢰를 흔들 수도 있다”며 “이에 웹3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웹3의 핵심 원칙인 오픈데이터, 오픈소스, 데이터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해야 진정한 디지털 사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프리 상무가 말하는 웹3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란 의미다. 그는 “웹3는 단발성 유행이 아니라 평생 학습이 필요한 구조”라며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건 코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그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공동체다”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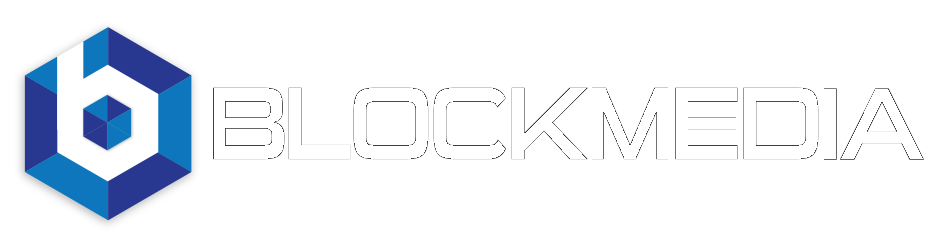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인터뷰] 제프리 츄이 “홍콩, 민·정 협력으로 웹3 생태계 설계 중” [인터뷰] 제프리 츄이 “홍콩, 민·정 협력으로 웹3 생태계 설계 중”](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smush-webp/2025/04/Screenshot-2025-04-17-at-3.44.25 PM-1200x938.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