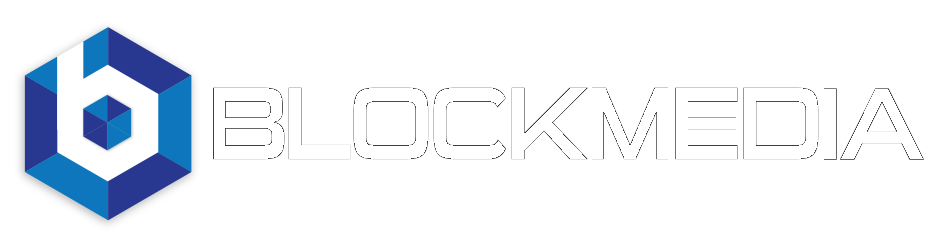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서울=뉴시스 박미선 기자]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일본 투자자들이 21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국제 채권을 팔아치웠다. 어떤 종류의 채권을 매도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미국 국채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는 월가의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재무성의 예비 통계 분석을 통해 일본의 은행, 연기금 등 민관 기관이 3월 말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만기가 긴 해외 채권을 175억 달러(약 25조원) 매도했고, 그 다음 주에도 36억 달러(약 5조원)를 추가로 팔아치웠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국제 채권 매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2주 동안 가장 큰 규모의 매도세다.
일본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합쳐 미국 국채를 총 1조1000억 달러(약 1563조원)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보유량이다. 그런 만큼 일본의 국제 채권 거래는 미국 국채 매매의 대표 지표로 간주돼 면밀히 모니터링된다.
해외 채권 이탈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했다.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은 크게 흔들렸는데 2일 이후 4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는 12% 급락했다. 국채도 같은 기간 거센 매도세에 휩쓸렸다. 9일 오전 4.5%였던 10년물 금리는 11일 4.6%에 근접해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일본 재무성 보고서는 어떤 종류의 장기 채권이 매매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미국 국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본 노무라은행의 수석 금리 전략가 시시도 토모아키는 “일본의 매도 중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 또는 미국 정부기관 채권(모기지담보채 등)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매도는 (미국 주식이 폭락해)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발생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은행이나 생명보험사가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매도세는 일본 은행들이 사용하던 헤지 전략을 청산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저금리 국가에서 자금을 빌려 고수익 국가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활용하던 투자자들이 트럼프발 무역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본에서 저리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미국 자산을 일시에 팔아치웠단 것이다.
다만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일본 담당 이코노미스트 스테판 앙그릭은 “일본 투자자들이 매도한 미국 국채 규모는 상당하지만, 4월 초 국채 금리 급등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라며 “미국 국채 시장은 하루 평균 1조 달러에 가까운 거래량을 기록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이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이 7843억 달러, 영국이 750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