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상장 직후 ‘황금알’로 불린 전략, 지금은 왜 자취를 감췄을까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BTC)이 제도권에 진입한 이정표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미국 승인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전통 금융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시장은 새로운 유동성의 물결로 들썩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물-선물 차익거래(Cash-and-Carry Arbitrage)’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있었다. ETF와 CME 비트코인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 전략은 무위험 수익 구조로 여겨졌고, 한때 연 수익률 10%에 달하는 ‘황금알’로 불렸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이 전략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단순한 차익거래 전략은 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을까?
# 차익거래의 기초, ‘베이시스’란
차익거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베이시스(Basis)’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베이시스’는 특정 자산의 현물 가격과 해당 자산의 선물 계약 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베이시스 = 현물 가격 – 선물 가격
이 값이 양수일 경우 ‘양(+)의 베이시스’ 혹은 ‘프리미엄’이라 하며, 반대로 음수이면 ‘음(–)의 베이시스’ 또는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베이시스는 헷지(헤징) 전략 수립에도 유용하지만, 특히 차익거래자들에게는 수익 기회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ETF 가격(현물)이 100이고 선물 가격이 101이라면, 투자자는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한 뒤, 선물 만기 시 두 가격이 수렴할 때 차익을 실현한다. 이 전략은 보통 캐시 앤 캐리(Cash-and-Carry Arbitrage)로 불린다. 전통 원자재 시장에서 널리 쓰였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ETF 상장 초기 널리 활용됐다.
# 2024년, ‘황금알을 낳는 전략’이던 시절
ETF 승인 직후, 기관 자금은 쏟아져 들어왔다. ETF는 규제를 받는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평가됐고, 기관 입장에선 보관,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낮았다. 수요는 공급을 초과했고, ETF는 순자산가치(NAV)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반면, CME 비트코인 선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 구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현물 롱 + 선물 숏’ 전략을 수행하는 투자자는 연 5~10%에 달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미국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헤지펀드와 트레이딩 데스크들은 경쟁적으로 이 전략에 뛰어들었고, 매월 반복 가능한 ‘기계적인 수익 구조’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2025년 들어 급변했다.
# 2025년, 전략은 왜 무너졌나?
- 프리미엄의 소멸
전략이 알려지자, 수많은 기관들이 동일한 구조로 시장에 진입했다. ETF 매수 → 선물 매도 구조가 반복되면서, ETF 프리미엄은 점차 줄었고 프리미엄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역베이시스(선물 가격 < 현물 가격) 구간도 등장했다.
2025년 3월부터 4월 초까지의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한때 1% 이상이던 CME BTC 선물 프리미엄은 0.1%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 비용(ETF 수수료, 슬리피지, 선물 롤오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0%에 수렴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차익거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인데스크는 “BTC 차익거래 전략 수익률은 약 2% 수준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낮다”며 “기관들은 더 낮은 리스크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국채나 MMF(머니마켓펀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과 함께 비트코인은 1월에 $109,000까지 급등했다가,3월 초엔 트럼프의 관세정책 우려로 $76,000까지 급락했다. 이런 변동성은 ETF 대규모 환매로 이어졌고, ETF 가격이 NAV보다 할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가 일관되지 않으면, 전략이 아예 통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3월 초에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는 ‘역베이시스’ 현상이 나타났고, 이때 일부 기관들은 포지션 청산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
- 현실적인 자본 효율성 문제
‘현물 롱 + 선물 숏’ 전략은 이론상 무위험이지만, 현실에선 큰 자본이 묶인다. 현물(ETF) 매수를 위한 현금 자본, 선물 포지션 유지에 필요한 증거금, 추가적인 헤지와 롤오버 비용, 이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ROI(자본수익률) 측면에서 경쟁력이 급감한다. 따라서 자금 운용에 민감한 헤지펀드들은 더 유연한 파생상품 전략(옵션, 롱숏, 델타 헤지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 투자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자금 흐름의 변화는 데이터로 확인된다. 데이터 플랫폼 파사이드(Farside)에 따르면, 2025년 들어 미국 비트코인 ETF 전체 순유입 규모는 361억 달러로 2024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비트코인 미결제약정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4월 19일 기준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은 14만1280 계약, 총 약 119억 달러로 집계됐다. 1월 20일 기록했던 직전 최고치 203억4000만달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기관 자금이 차익거래에서 철수하고 안정적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시장은 진화 중… 단순 전략은 끝났다
차익거래는 ‘시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단순한 ETF-선물 포지션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기관들은 옵션, 델타 헤지, 장단기 스프레드, 혹은 시장 중립 전략 등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택하고 있다. 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는 “이제 ETF 사고 선물 매도하는 전략은 끝났다”며 “비트코인 ETF 시장은 지금부터”라고 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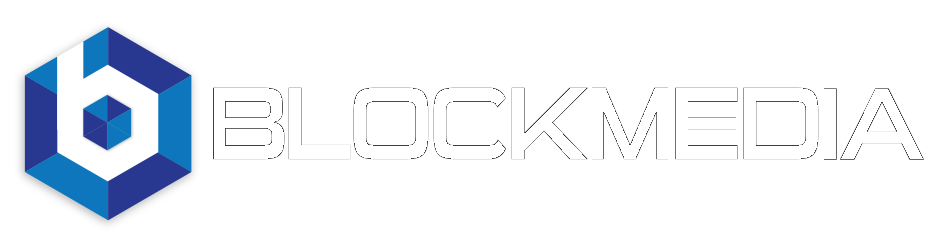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명정선의 톺아보기]사라진 차익거래… 비트코인 ETF 프리미엄은 어디로 갔나 [명정선의 톺아보기]사라진 차익거래… 비트코인 ETF 프리미엄은 어디로 갔나](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smush-webp/2025/04/ChatGPT-Image-2025년-4월-19일-오전-08_56_14-1200x800.png.webp)

